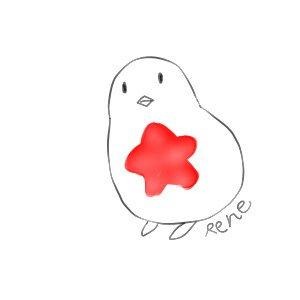티스토리 뷰
세계가... 무너져간다.
세계는 짜였던 퍼즐이 풀리고 흩어져, 네모난 모자이크가 되어 조각조각 춤추듯 떨어지고 있었다. 차갑게 절멸로 향하는 흑백의 항연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꽤나 장관이어서, 그림으로 본다면 꽤나 황홀할지도 모르겠네.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다. 그래도 이런 사실은 죽을 때까지 알고 싶지 않았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이 광경만큼은 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했었다. 그럼에도 세상은, 무엇이 문제였는지 순식간에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너무나도 허무하게 바스러져가고 있었다. 나는 그저, 그저 히카리가 웃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었을 뿐인데. 완벽하진 못했어도 결국 다 잘 된 줄 알았는데, 뭐가 잘못되었던 걸까? 목구멍으로 슬픔이 고여 아무 말도 토해낼 수조차 없었다. 완벽한 절망 앞에 끝없는 비참함만이 맴돌았다.
"계약자 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기나긴 여정의 끝에서 언제나 나를 지탱해주던 목소리. 차가운 모습과는 달리 어떠한 악마들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설녀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려왔다. 유키.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나직하게 내뱉었다. 아까까진 분명 말을 못할 것처럼 목이 멨는데, 그녀의 이름은 너무나도 쉽게 나왔다는 게 신기해져서 잠시 비참함을 잊을 수 있었다. 늘 자신을 위해줬던 그녀였으니, 아마도 저 말은 자신의 진심이겠지. 게다가 다 망해가는 판에 굳이 비위를 맞춰줘야 할 이유도 없으니까 그 진의를 의심해 볼 필요 따윈 없을 것이다. 사실 그게 아니어도 그녀라면 괜찮지 않을까.
그녀는 항상, 그렇게 나를 지탱해줬었고, 절망적인 지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말을 항상 주고 있었으니까. 유키에게 받은 것은 너무나도 많아서 언제나 감사했고, 늘 그것을 전하고 싶었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도 나는 여전히 그녀에게 받기만 하고 있었다. 한심한 녀석. 그러고도 네가 날고 기는 신과 악마들의 계약자라니, 그들이 속으로 얼마나 비웃고 있었을까? 거기까지 이르자 또다시 비참함이 느껴졌다. 유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차라리 원망을 해주는 게 편할 텐데. 하지만 상냥한 그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점이 더 비참하게 만든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겠지. 어떻게 하면 이 비참함을 없앨 수 있을까? 차라리,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나았을지도 몰라. 이렇게 될 거였다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유키."
"아무리 결과가 나빴다고 해도, 그 이전에 해왔던 것들을 부정하진 말아주세요. 누군가를 구했던 것도, 그들에게 행복을 되찾아줬던 것까지 무의미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찰나의 행복은 오히려 희망고문이 아니었을까? 그것마저 그녀는 부정해주었다. 의미 있었다고 말해주어서, 조금은 기쁠지도. 아니 사실은, 많이 기뻤다. 살아오면서 무조건 나의 편을 들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성공한 거라고 했었던가. 나에게 있어선 유키가 그런 존재였다.
세계는 여전히 굉음을 내며 사라져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절망의 하모니와도 같았지만, 지금에 있어선 조금 신경 쓰이는 소음으로 밖에 들리지 않았다.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 걸까. 나는 차분히 무너져가는 세계를 응시했다. 이 속도면 아마, 내일이면 이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지. 그다지 길진 않은 시간이었지만, 사소한 무언가를 해낼 수는 있는 시간이었다. 그동안에 내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마도...
"유키."
"네, 계약자님."
"...... 계속 옆에 있어줄래?"
"물론이지요."
세계가 무너지더라도, 한 마디라도 더 이야기해야지. 나의 이야기를, 나의 마음을 너에게. 얼마나 제대로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유키는 따스함에 닿아 녹아버릴 것 같은 눈처럼 처연하지만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내 곁에 앉았다. 나는 그런 유키의 눈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오늘은 계속 이야기하자. 너와 내가 살아왔던 세계와 시대의 이야기를. 세계가 끝나버리는 순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