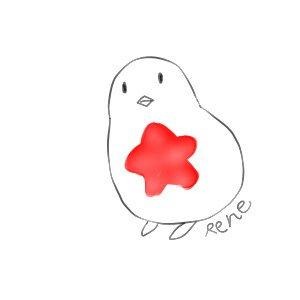빛이 없는 세계. 그곳은 그렇게 불렸다. 사실 빛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다들 그렇게 불렀다. 아무것도 없다가 정확하지 않을까 싶지만, 그 명칭이 익숙해졌기에 모두들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그곳에는 어울리지 않게 호화로운 저택 하나가 우뚝 서있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어울리지 않게 처참한 듯한 한숨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그 한숨의 주인공은 그곳의 주인인 작은 소녀 - 정확히는 소녀의 형태를 한 인형 - 이었다. 소녀는 지쳐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사유는 한참 전에 자신의 수용치를 넘어버린 헤럴드들 때문이었다. 일단 자신에게는 헤럴드라고 불리는 이들의 기억을 찾아줘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꽤나 손이 많이 가고 어려운 일이었고, 때문에 굉장히 제한된 숫자에게만..
"선택해라. 부조리를 받아들이고 죽을 것인가, 뒤틀림을 거부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끝을 향해가는 어느 이야기. 몽롱해지는 의식을 간신히 부여잡으며 보이는 주변 풍경은 촛불에 초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일렁이며 여자를 한층 더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어그러짐 속에서 딱 하나 분명한 존재가 자신을 향해 선택을 종용하고 있었다. "나는..." 이대로 끝나기 싫다. 이 납득할 수 없는 결말을 부정하고 싶었다. 이것이 올바른 운명이 아니라, 무언가로 인해 부정당한 것이라면... 그 미래를 되찾는 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얼마든지... "찾을 거... 야!" 손을 뻗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손으로 붙잡을 것이다. 그토록 찬란하던 인생을. 설사 그것이 저 재수..